<에세이스트의 책상>이란 배수아 작가의 장편소설을 읽고 남긴 메모의 한 부분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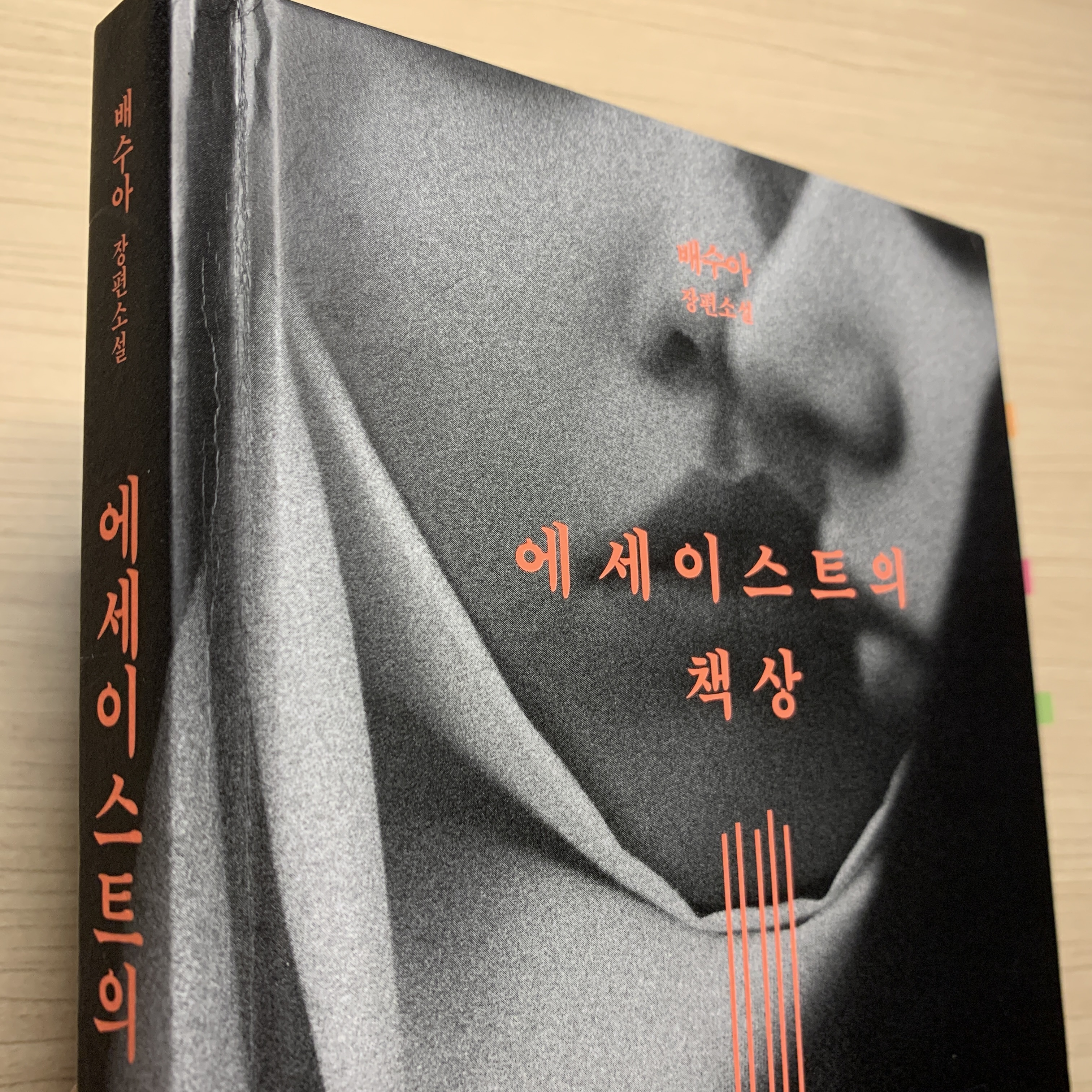
나는 방금 매우 낯설고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를 만났다. 그건 언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닌 세상이다. 한없이 고독하지만 어디론가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다. 나를 전혀 다른 곳에 데려다 놓는 음악이다.
낯설지만 빠져들고 싶은 세계. 친절하게 웃으며 손 내밀 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을, 혹은 어떤 세계를 조용히 응시하며 서서히 밝히는 문장들.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만히 바라보듯 그려냄으로써 다가가고 싶어 쓰인 이야기를 오랜만에 만났다.
22.06.27 일기장 메모 중에서
처음 이 책을 읽으며 나는 자주 길을 잃었다. M에 대한 묘사로 시작한 글은 어떤 암시도 없이 갑자기 특정 장면으로 나를 데려가 숨 막힐 듯한 임사체험을 제공하다가 갑자기 3년 후로 돌아간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특정 장면들은 계속해서 끼어든다. 마치 한낮의 백일몽처럼. 나는 몇 안 되는 인물들 사이에서도 길을 잃었다. M과 요아힘이 같은 사람인지, 갑자기 에리히는 누구인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의 가족들은 이야기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책을 반쯤 읽었을 때도 혼란스러워 후루룩 넘겨 책의 마지막 문장을 펼쳤다. 여전히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었다.
그쯤 되면 책을 덮고 어딘가로 치워두었을 법도 한데, 나는 잘 모르는 그 낯선 세계를 계속 읽어나갔다. 그건 1인칭의 화자 때문이었을 것이다. 화자의 목소리가 묘하게 나를 끄는 데가 있었다. 자기 연민이나 과시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기억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 장면을 되살리고 대화를 복기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을 다시 해석한다. 그건 글을 쓸 때 경험하는 시간들과 유사하다. 모든 기억은 순서대로 오지 않지만 하나의 기억이 또 다른 기억을 불러내며 거기엔 어떠한 연결이 있다. 그렇게 나는 과거의 시간을 다시 살아내고 현재의 나를 끊임없이 재생하며 과거 속으로 밀어낸다.
그렇게 혼란 속에서 알 수 없는 아름다움을 느끼며 걸어 들어간 세계를 나는 연거푸 다시 읽어가기 시작했다. 그제야 맞춰지는 퍼즐 조각들이 있었다. 아직도 흘러가는 책장과 펼쳐지는 시간은 혼란스럽지만 ‘내’가 등불을 비추는 사람이 누구인지, 현재와 무수히 겹쳐지는 과거의 시간들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 책을 읽으며 내가 문학에 매료되었던 지점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것은 불가능할 것임을 알고도 시도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에 대한 사랑이다. 나의 언어는 눈앞에 있는 대상을 그려내기에 한없이 불완전할 것이다.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또렷할 것만 같았던 어떤 장면들은 계속해서 부식되어 간다. 그럼에도 그 장면을 내 안에서 되살리고 내가 되살려낸 장면을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하나 언어로 표현해 나간다. 그렇게 다시 만들어진 장면이 타인에게 가 닿는다면 그건 독자, 그러니까 읽는 사람에게 속한 장면이 된다. 언어를 매개로 읽어낸 사람이 새롭게 만들어낸 장면. 그렇게 “시간의 고리는 구형으로 연결되어 서로 관통하고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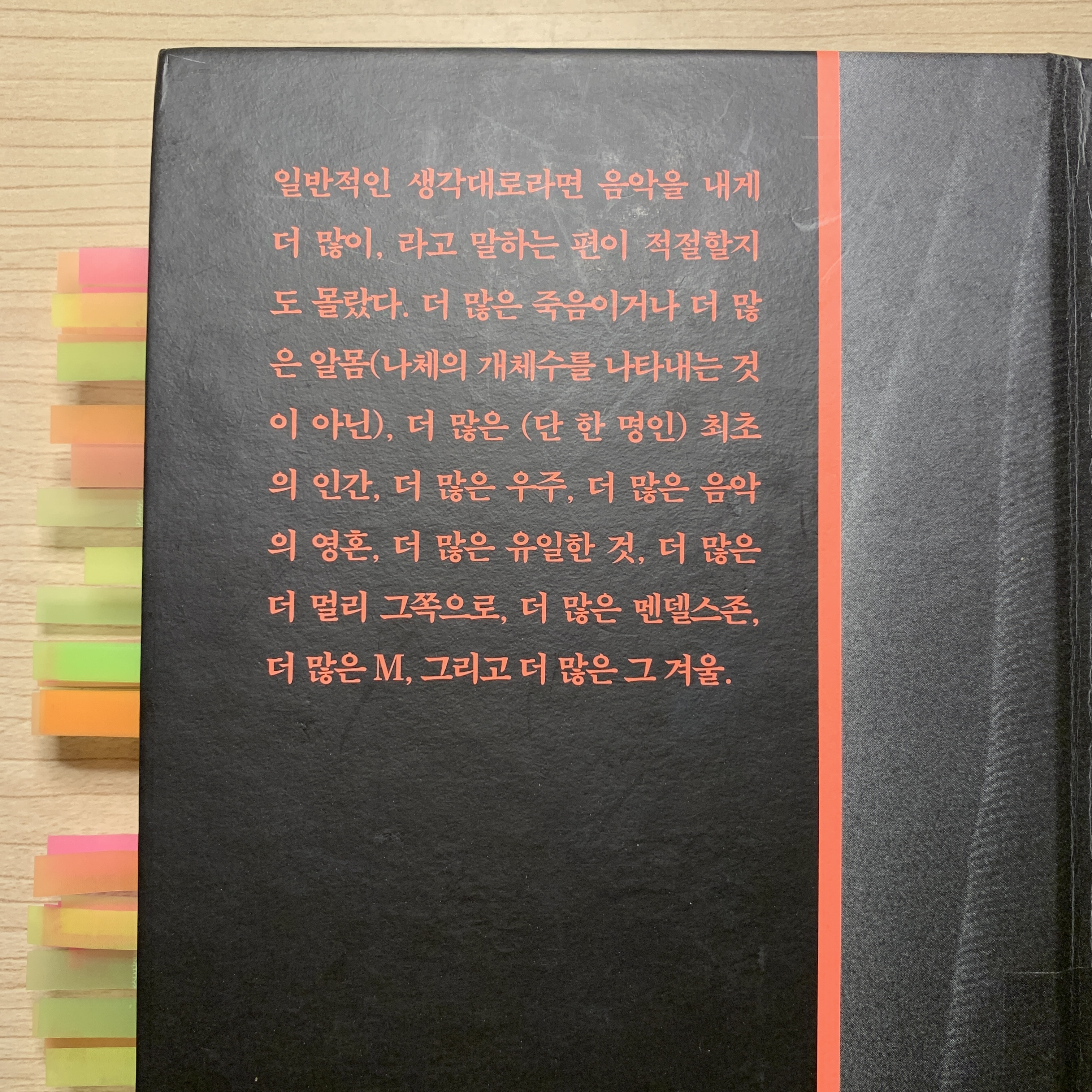
이 화자의 목소리가 물웅덩이에 빠져 자꾸만 발을 헛디뎌가며 헤매는 나를 붙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사람, 그럼에도 그 군중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나를 붙들었다. 나 역시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읽고 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굴과 모래, 지구에서 사라져 가는 것들 (0) | 2022.11.15 |
|---|---|
| 삶과 예술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비비안 마이어 전기> (0) | 2022.10.10 |
| 다시 읽어야 보이는 것들 “상호대차; 내 인생을 관통한 책” (0) | 2022.06.20 |
| 글로 이어진 인연이 있다면, 이별은 없는 걸까 “내 사랑 백석” /김자야 (0) | 2022.06.12 |
| 그러나 아름다운, 음악과 삶의 이야기 (0) | 2022.03.31 |


